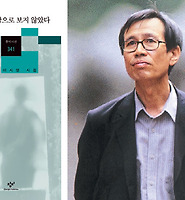함께쓰는 민주주의
[시대와 시] 비극적 서정의 전위로, 그리고 강정으로-황지우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본문
비극적 서정의 전위로, 그리고 강정으로
-황지우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글 서효인 시인 humanlover@naver.com
역사는 발전하는가. 시는 질문에 답하는 장르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장르이다. 1983년 신군부가 열어놓은 컬러의 시대에 황지우 시인은 말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시인은 세상을 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사람이고, 세상을 뜨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우리 발붙일 곳은 결국 암석과 바다이다. 그들은 몇 만 년의 격동을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온 지구의 진정한 주인일지 모른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밟고 서 있을 면목이 없다. 우리는 살아 있어서, 우리가 살아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파괴한다. 우리가 세상을 가볍게 뜰 수 있는 새였다면, 구럼비 바위에 폭탄이 설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위가 가루가 되어도 나와 우리 가족의 안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를 부수고 바다에 콘크리트를 처넣는다. 그리고 황지우의 시를 읽는다.
오늘도 무사히
청계천 기둥 세 개만 남아 있으리라
남대문은 벽돌 조각으로 덮여 있으리라
남산 송전탑은 길게 가로누워 있으리라
지하철 속으로 빈 바람이 소리내어 불며
도큐 호텔에서, 5세기 후 발굴단 인부들이, 달라붙은
남녀의 화석을 긁어낼 것이다
손바닥에 침을 뱉고 그들은 낄낄대리라
디럽게 붙었네 잡것들이!
아 오늘 나는 살아 있다
그 폐허의 블록보도를 지금 걸으며
5세기 후 도마뱀의 눈에
잠깐 비췬, 태평로 아스팔트 웅덩이에 괸 물을 나는 잠시 바라보았다
보았다 나는 오늘, 무너진
대리석과 흰 철근 사이의 털난 잡풀을
호텔 롯데와 프라자 호텔이 차단한 그늘 속에서
아아 오늘 나는 살아 있어서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간다 휘파람을 불며
모든 잠시 있는 것들을 나는
추모한다 유행가와 슬로건과 아취를
광화문과 시청과 미 대사관과 해태와
어제 개관한 교보 빌딩과
………………………
이 묵음 부호 속에 들어갈 말 못 할 더 많은 것들을
오래된 도시 서울이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간 기간은 500년이 넘는다. 물론 강남으로 대표되는 개발 광풍은 그 옛날 김수영이 닭을 치며 바라보던 한강의 예전 모습을 모두 없애버렸다. 모래사장에서 헤엄을 치던 한강변의 모습은 흑백으로 옛 모습을 재현하는 자료화면에서나 볼 수 있다. 어쨌든 서울은 인간에 의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도시로 모습을 바꿨고, 그렇게 지금의 서울이 되었다. 과연 서울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시인가. 아니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도시인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도 같다. 토건의 광풍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좁은 국토를 여기저기 할퀴어 놓았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는 강과 산, 들과 숲을 가리지 않고 일단 파헤치고 밀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황지우의 역사와 인간이 가진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유행과 슬로건’을 따라 묵음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소시민은 나이기도 하고, 당신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는 파괴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황지우 시인은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문학과지성사, 1983)를 통해서 당대의 대한민국을 축소한다. 그곳은 무리를 지어 좌절하는 젊은이들과, 산산조각 나는 희망 같은 것이 있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우리 대부분은 애국가의 끝물에 따라 주저앉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제주의 바람결에 몸을 맡긴 사람이 있다. 지난밤 텔레비전에서는 제주 강정마을에 잠시 보도되었고, 반대하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경찰들의 검은 얼굴이 보였다. 해군은 사람이 탄 카약을 밀어붙여 바다로 전복시켰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떨구었다. 한라산은 멀리서, 60여 년 전 4·3항쟁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비극을 모조리 보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며, 미항은 더욱 결단코 아니고, 그들의 뜻에 따르면 민군복합항구가 될 것이다. 미군기지가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제주도에 비극을 반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그건 나였다. 텔레비전을 보며 짧은 감상을 한 후, 저녁 밥상 앞에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었고, 강정 마을에 몇 만원을 텔레뱅킹으로 부친 후에 가요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다. 그리고 아이돌이 추는 춤을 본다. 채널을 이리 돌리면 종편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가 나온다. 채널을 저리 돌리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자가 울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리모컨을 돌리다보면 새처럼 세상을 날아오른다. 이미지가 되어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바위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주위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오랜 세월 그곳을 지킨 터줏대감이라고 하더라도, 사라질 것이다. 시급한 안보 상황과, 급박한 국제 정서라고 불리는 어떤 욕망들 때문에. 그런 욕망이 발전시킨 역사가 지금의 역사이다. 그들의 역사에 사람은 없다. 욕망만이 들끓을 뿐이다. 황지우의 시를 다시 읽는다.
베이루트여, 베이루트여
조간에는, 피맺힌 절규…… 통한의 유랑길이라고 하고 석간에는,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고 씌어 있다.
제목도 아침 저녁 형형 색색으로 뽑아놓았다.
‘나의 조국’ 합창하며 투쟁 다짐
PLO 떠나던 날 ‘우리는 조국 땅에 다시 온다’
꺼지지 않은 채 흩어진 ‘불씨,’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총구마다 아라파트 초상화,
‘전세계서 지하 투쟁’ 선언.
(아, 이 말이 모두 외신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베이루트 21일 AP 전송—연합]으로 받은 사진들.
ⅰ) 털이 덥수룩한 중년 사내가 군복 차림으로 어린 딸과 작별한다.
ⅱ) 미제 M16과 소련제 AK47 소총을 든 앳된 소년 전사와 백발의 전사가 레바논군 트럭에 실려 베이루트 항으로 향하고 있다.
ⅲ)한 팔레스타인 여인이 아라파트 머리를 움켜 안고 이마에 키스하고 있다.
(중략)
이 갈갈이 찢어죽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의 새끼들아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 외신은 울음의 전도체인가, 아닌가
황지우가 양식을 파괴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세상에 토해냈던 때는 30년 전이다.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양식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형식도 없고 절차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시가 아니다. 아니다. 모든 것이 시라고 말했던 시인의 말을 따라, 우리의 삶은 비극적 시이고, 모두가 서정이다. 오늘도 발파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 해군참모총장이 확언한다. 시인은 확언하지 못한다. 옮겨 적지도 못한다. 다만 어떤 강력한 예감을 발설할 뿐이다. 이런 짓을 계속하면, 지난 30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30년을 살 것이라면 우리는 비극의 서정을 살아야 한다.
황지우 시인은 비극적 서정의 전위에 자신을 놓았다. 해군과 토건 세력은 비극적 서정으로 우리 전체를 몰아넣으려 한다. 멀리서 폭파음이 들린다. 한라산은 모두 보고 있다. 인간은, 우리는, 대체 어찌하려고 지금 이 지경으로 사는가. 그들에게는 ‘이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제발, 강정을 그냥 두어라. 제발.
'문화 속 시대 읽기 > 시대와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대와 시] 미친 춤의 시대 -김혜순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0) | 2012.08.28 |
|---|---|
| [시대와 시] 우리는 깃발을 믿지는 않지만 (0) | 2012.07.16 |
| [시대와 시] 여기 노래가 그리고 날개가 (0) | 2012.06.12 |
| [시대와 시] 슬픔을 길어 올려, 지금 다시 광주로 -임동확 <매장시편> (0) | 2012.05.10 |
| [시대와 시] 청춘을 타전함 -안현미 시집 『곰곰』 (0) | 2012.04.13 |
| [시대와 시] 당신과 나는 모두 사람이었다 - 이시영 시집『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0) | 2012.02.10 |
| [시대와 시] 아프고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0) | 2012.01.16 |
| [시대와 시] 이 무거운 물음에 답할 수 있겠는가 - 송경동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0) | 2011.12.08 |
| [시대와 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0) | 2011.11.11 |
| [시대와 시] 사평역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 곽재구 '사평역에서' (0) | 2011.10.18 |